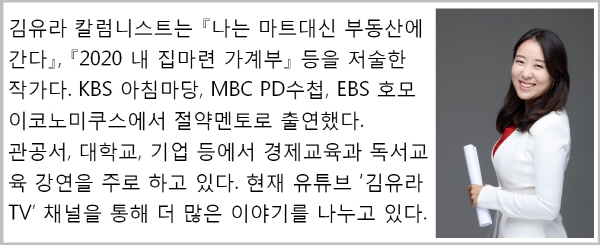[한국강사신문 김유라 칼럼니스트] 스물두 살,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갔던 낯선 땅 호주에서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마른 몸에 하얀 얼굴의 그는 잘 웃고 착했다. 축구, 농구 등 운동도 곧잘 하는 모습은 평소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내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자질이 충분해 보였다.
우리는 2년을 연애했고 곧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 연애 시절 남편은 나의 조언을 받아들여 전기기사 시험을 준비했고, 책과 담쌓고 살았던 나와 달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데 소질을 보였던 그는 곧 공기업에 취업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는 조건으로 ‘맞벌이’를 내걸었다. 둘 다 가진 게 없는 만큼 함께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고, 급한 대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전업주부가 꿈이라고 해도 대학을 4년이나 다녔으니, 그간 쏟아부은 등록금이 아까워서라도 돈을 벌긴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학벌도 좋지 않고 스펙도 없는 나의 구직활동이 쉬웠을 리 만무하나, 기적적으로 국민은행 텔러 1기 계약직에 합격하게 되었다. 지금도 어떻게 15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지 의아할 따름이다.
2006년 4월부터 2주간 합숙 연수를 받고 5월부터 지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평소 덜렁대는 성격의 나는 은행에서도 실수가 잦았다. 약속어음을 거꾸로 처리해서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는 일도 많았고, 시재가 잘 맞지 않아 몇 번이고 계산을 다시 하느라 제일 꼴찌로 퇴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그해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다이어트를 하느라 잘 먹지도 못해서 늘 기운이 없었다. 집에 가면 무조건 잠부터 잤다. 하루 9시간은 자야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드디어 백마 탄 왕자님을 만나 결혼에 골인한 내 앞에는 그림 같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제2의 IMF가 와도 공기업에 다니는 내 남편은 끄떡없을 것이며, 은행원이 된 나는 제법 재테크를 잘하고 자산을 잘 굴릴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게다가 누구보다 순수하고 날 사랑했던 남편은 평생 내게 다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아이만 태어나면 행복의 완벽한 그림이 완성될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당연히 결혼은 상상과 달랐다.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안락한 집’, ‘행복한 가정’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었다. 결혼을 하니 전보다 더 힘들고 피곤했다. 밥도 내가 해야 했고 설거지도 내가 해야 했다. 남편과 가사를 분담하긴 했지만, 결혼 전에는 안 하던 일을 하면서 회사까지 다니려니 죽을 맛이었다.
게다가 은행원이라는 이유로 돈에 대한 모든 관리와 결정을 내가 떠맡게 되었다.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일부터 재테크까지 모두 말이다. ‘아, 이런 게 어른의 삶이구나’ 싶었다. 실수하고 잘못한 일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 생각보다도 훨씬 무겁고 어려운 일이었다.
※ 참고자료 : 김유라의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 돈도, 시간도 없지만 궁색하게 살긴 싫었다(차이정원, 2018)』